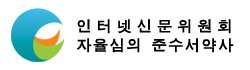|
| ▲ |
세계 인공지능(AI) 전장(戰場)에서 안심이란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시시각각 순위가 뒤바뀌는 치열한 각축 가운데, ‘AI 합종연횡(엔비디아와 오픈AI의 140조 원에 달하는 전략적 동맹)’과 ‘AI 버블 논란(메타의 1,000억 원대 인재 인센티브에도 메타를 떠나는 등)’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은 이를 방증(傍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8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세계 ‘AI 3강’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돌입했다. 내년도 AI 관련 예산은 올해 세 배인 10조 1, 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렇듯 정부가 AI를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인 가운데 대기업들도 AI를 경영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SK그룹은 지난 9월 25일 AI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한 울산에서 포럼을 개최했고, LG그룹도 이날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사장단 회의를 열었다. SK그룹의 AI 전략은 데이터센터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제조업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LG도 AI 중심의 사업 전환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두 그룹의 AI 전략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인류는 AI 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대(大)전환기를 맞이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10월 1일 주최한 ‘미래 컨퍼런스 2025’에서 ‘AI 혁신과 산업 대전환’을 주제로 AI 대전환이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성이라는 공감대 속에 한국이 AI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를 가진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우리의 제조 역량은 AI 대전환의 지렛대”라며 “강점을 최대화하면서 서로 융합해 중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강국을 향한 정부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중국을 추격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환(AX)의 핵심 8대 키워드로 ‘ALLIANCE(얼라이언스)’를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축적해온 제조 역량과 데이터 등 강점을 최대화하면서 정부와 제조·금융·서비스 기업들 사이의 연결이 활성화되면 AI 세계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얼라이언스(ALLIANCE)’는 우리가 가진 제조 역량을 고도화(Advance)해 서로 연결(Link)하고 이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서 투자를 끌어내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혁신(Innovation)이 속도감(Acceleration) 있게 진행되고 향후 생태계화(Network) 및 융합(Convergence), 확장(Expansion)도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중국이 10년 전만 해도 볼펜 심하나 못 만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로봇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남들보다 두 배 빠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 연구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자칫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커 발생하는 ‘화이트아웃’ 정전 위험이 있는 만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산업통상부는 민·관 제조 인공지능 전환(AX)의 ‘MAX 얼라이언스(ALLIANCE)’를 출범시킨 데 이어 2030년까지 AI 팩토리를 500곳으로 확충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세계적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AI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픈AI의 ‘샘 올트먼(Sam Altman)’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미국의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 지원을 당부했고, 대한민국 국가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오픈AI와 손잡고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하게 됐다.
AI 혁신에 시동이 걸린 바로 지금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기업과 학계가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R & D)에 앞장서고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구조 개혁으로 뒷받침해 AI 대전환을 이뤄야 저성장의 늪에서 하루빨리 탈출할 수 있다. 이때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미래컨퍼런스 2025’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문승일 연구원장은 한국이 과도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 때문에 전력망이 붕괴할 수 있는 ‘화이트아웃(White out)’ 고(高)위험국이라고 경고했다. ‘블랙아웃(Black out)’이 전력 초과 수요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라면 ‘화이트아웃’은 공급량이 수요량을 과도하게 넘어설 때 발생한다. 또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전력망 확충 계획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전력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매달리느라 AI 시대에 치명적인 전력 수급 실패를 겪지 않도록 원전을 활용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고,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 규제’를 당장 걷어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지난 9월 15일 처음으로 열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한 바 있다. 산학연정(産學硏政)이 힘을 합쳐 AI 역량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라는 이른바‘335 공약(公約)’도 허망한 장밋빛 말 잔치로 ‘빈 공약(空約)’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제조업의 고도화는 참으로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기존 제조업에 AI를 연결·접목하는 작업이 긴요해 보인다. 전 산업의 AI대 전환과 맞물려 K-제조업의 AX를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제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AI 산업 자체의 고도화까지 기대해 볼 여지가 충분하고 남음이 있어 보인다. AI를 연구개발(R & D)에 접목해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작업 오류를 최소화한다면 제조업의 성공 기대치는 더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자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흡수하고 적용·활용에는 빠르고 큰 강점을 보여왔다. AI 반도체는 물론이고,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부(富)로 만들어지도록 과감하고 파격적이고 파상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AI는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고 기업은 그 한가운데에 있다. AI를 모르고는 미래 ‘글로벌 리더(Gloval leader)’ 국가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 이다. 우리나라는 10년 전 알파고 바둑을 통해 AI를 접하고도 국가적 차원의 육성과 지원을 게을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AI 강자로 등장해 세계를 지배하려 들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야 AI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은 뒤늦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커도 너무 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늦어진 만큼 보다 강력하고 결연한 실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정책 의지가 식거나, 꺾이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집권 초반 허니문(Honeymoon) 기간 보여주는 강력한 애정과 깊은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추동력(推動力)과 추진 모멘텀(Momentum)이 더욱 중요하다. AI 전환에 민·관이 협력하여 국가의 명운을 걸고 총력을 경주해야지 자칫 머뭇거리거나 게으름을 피우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다가는 영원한 낙오자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기술 대(大) 전환의 시기를 얼마만큼 유연하게 수용하고 선제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기업은 물론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 유념해야만 한다. 특히 최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나서서 자국 산업에 대한 발전의 집중도를 높이고 직접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고도화에 기업은 물론, 정부가 큰 힘이 돼주어야만 한다.
[저작권자ⓒ 제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